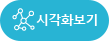| 항목 ID | GC60005341 |
|---|---|
| 한자 | 無等山風水 |
| 이칭/별칭 | 서석산 풍수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동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김경수 |
광주광역시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에 대한 풍수 해석.
무등산 풍수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구, 전라남도의 화순군과 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의 자연지리를 음양오행설로 풀이한 해석이다.
무등산은 산 모양이 무덤을 닮아 '무덤산', 너덜과 주상절리가 많아 '무돌산'이 한자로 옮겨지면서 '무등(無等)' 또는 '서석(瑞石)'이 되었다. 극락강과 대비한 불교 풀이 기원도 있다.
무등산은 꼭대기에 9천만 년 전 중생대 화산 활동 때 펄펄 끓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수직 방향으로 갈라져 생긴 돌기둥이 우람한 비수 모양으로 서 있다. 이름하여 입석대(立石臺)와 서석대(瑞石臺)이다.
무등산은 호남정맥 한복판에 자리한다. 전라북도 장수군 영취산에서 '주화산~내장산~설산'을 거쳐 창평 월봉산에 이른 멧발[산줄기]은 고서 고산(高山), 지실 별뫼에서 유둔재 과협을 감돌아 무등으로 솟구친다. 아침햇살과 저녁노을이 달리 비쳐서 해석도 구구한 용(龍)은 두 갈래로 뻗으면서 광주광역시를 보듬고 있다. 서쪽으로 내린 능선은 바람재를 거쳐 향로봉에서 북쪽으로 올라 장원봉 자락을 이루어 우백호가 되고, 남서쪽으로 치달려 너릿재를 거쳐 '분적산~장군산~양림산'으로 이어져 온 광주공원 성거산 등성이는 좌청룡에 해당한다. 이 울타리 안에 광주광역시가 형성된 것은 고려 때로 여겨진다.
무등산 북사면에서 흘러내린 시내와 광주천은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젖줄이다. 안정된 수세는 조선시대 수전농업, 일제강점기 이후 상수도 수원지가 되었다. 아버지같이 든든하고 어머니처럼 포근한 산인 무등산은 이웃을 대하는 친구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광주인의 고해성사지이다.
- 김경수, 『광주 땅 이야기』(향지사, 2005)
-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